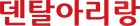한국인 일행 중에 영화제작을 위한 CG를 하는 김은우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성격은 조용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늘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인데 강에서 수영을 하겠단다. 그 강에 악어는 없어도 낯선 곳이라 다들 찜찜해 하는데 용감하게 입수해서 강을 건넜다가 온다.
알고 보니 이 친구 삼종경기 선수였다. 전 코스 완주도 몇 번 했었다는 강골이다. 은우는 영화제작용 CG와 관계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구상 중이란다. 이번 여행은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구상을 위한 소위 Gap Month 휴가인 셈이다.

포르투갈 일행 중에 크리스틴도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들어갔지만 중간에 되돌아왔다. 크리스틴은 인터넷결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은 리스본이고 직장은 알제리란다.
두세 주에 한번 꼴로 리스본과 알제리를 오가는데, 비행기로 두 시간 밖에 안 걸려 별 부담이 없단다. 정말 세상이 가까워지기는 했나 보다. 크리스틴과 은우는 운동마니아로 캠핑장에 도착하면 샤워 전에 늘 캠핑장 주변을 따라 조깅을 한다.
둘째 날의 저녁을 황홀 속에서 보내고 나니 마음이 들떠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자리에 둘러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내가 가지고 간 와인이 한 병 있어서 나눠 마시고 있으려니까 캠프장 관리인이 나무를 사겠느냐고 묻는다.
얼마냐고 물으니까 한 단에 50랜드(4000원 정도)란다. 갖다 달라고 하니 가져와서는 85랜드를 달라고 한다. Jan이라고 조금 어벙한 독일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산다고 하니 관리인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아프리카 말로 혼잣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일행 중에 호세라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을 나와서 MBA를 준비하는 청년이 재빨리 돈을 줘 보냈다. 그런 저런 불을 붙이고 두어 시간 불타는 장작을 보면서 잡담을 하다가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원래 다음 날은 오렌지 강에서 관리인의 안내로 카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젯밤 관리인의 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서인지 아무도 안 하겠단다. 바보 같은 놈. 돈 일이천 원 바가지 씌우려다가 고객만 놓친 꼴이 됐다.
그러고 보니 큐도 그 친구한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듯 저녁을 먹으며 이 집 바의 술값이 좀 비싸다고 했다. 다음 날 일정을 소개하면서도 아침에 하는 카누는 별 볼 것도 없고 힘만 든다고 했다. 아마 원래 좀 질이 좋지 않은 친구인가 보다.
오늘(3일차)은 180km를 달려 Fish River Canyon을 가는 날이다. 그 전에 나미비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번 여행의 핵심이 바로 나미비아 사막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미비아라는 말만 들어도 모두들 마음이 설렌다. 나미비아라는 국가 이름도 나미브(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사막이라는 데에서 유래 됐다고 한다.
나미비아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이 침을 흘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1884년 선교사들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독일이 이 지역을 점령한 이래 20여 년 동안 원주민이던 코이코이족과 헤레로족의 자주독립 봉기가 계속 됐다.
독일은 이에 강경대응으로 맞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 됐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중 남아프리카 연방(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일군을 격퇴하고 서남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1920년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합병됐으며 1990년에 와서야 겨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었으니 국가로서 체제를 갖춘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독일의 잔혹한 학살이 나중에 히틀러의 민족학살로 이어졌다고도 본다. 그런데도 나미비아에는 독일의 잔향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도시의 집들이나 거리의 모양이 거의 독일 도시를 보는 것 같고, 이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아프리칸’이라는 독일어와 현지어가 믹스된 말이다.
간간히 거리를 걷다 보면 독일식의 우아한, 그러나 색깔은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원색의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인네들을 보게 되는데, 독일 지배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입다가 거의 전통의상으로 토착화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