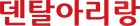■‘치과’ 명칭의 숙명
‘왜 우리는 치과라고 부를까? 아니, 왜 치과라고 해야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과 회한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 ‘치과’라고 하니 우리의, 그리고 환자의 시각이 좁아져 치과는 ‘치아를 치료하는 곳’으로 한계 지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입안의 침 분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미각을 잃어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치과에 가는 대신 이비인후과를 선택한다. 하물며 입안에 궤양이 생겼을 때에도 환자들은 이게 과연 치과에서 치료하는 게 맞는지 도리어 미안해하며 묻곤 한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속된 말로 ‘이빨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얼마 전 충격에 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온 치과대학 교수들이 그들을 ‘북경대학교 치과대표단’이 아닌 ‘북경대학교 구강대표단’이라고 소개한 것. 치과를 구강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들이 갖는 영역의 넓이는 두 세배, 아니 그 이상으로 넓어졌으며, 그들을 한계 짓는 울타리 또한 우리의 그것에 비해 몇 배, 몇 십 배 확장되었다.
치과라고 하는 것과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이다.
■네이밍으로 달라진다
네이밍(Nam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주로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네이밍은 상품명, 기업명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브랜드는 물론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담배인삼공사는 KT&G, 농협은 NH라는 새 이름을 통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진단의학과는 영상의학과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영역을 확장하여 쇄신하고자 한 것.
오래 전 수련의 시절 때 우편물을 받고 한참을 웃은 적이 있다. ‘치과대학 보철과’로 쓰여져 있어야 할 것이 ‘치과대학 고철과’로 쓰여져 있었던 것.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환자들은 실상 보철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정과와 무엇이 다르고, 구강외과와 치주과는 대체 어떨 때 가야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과별 이름도 어렵고, 치과라는 이름이 주는 한계성 때문에 환자들이 치과를 더 어렵고 멀게 느끼는 것은, 또 치과인들조차 스스로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과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것도, 과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머리와 맘을 지배하고 있는 치과가 갖는 그 숙명적 한계는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치아와 잇몸을 넘어 혀와 입 안팎의 근육, 입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포함한 ‘입’으로, 그리고 입을 넘어 전신으로의 확장된 개념으로, 더불어 입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양과 말과 소리로 이뤄지는 사회관계,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삶과 역사로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키다 보면 분명 우리 스스로조차 간과해 왔던 치과의 무한한 영역과 치과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 ‘충치’ 하나만 들여다보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으니 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