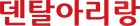개원하고 있는 치과원장 후배와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자신이 함께 일하는 Pay-doctor 즉, 봉직치과의사를 저희 병원에 있는 수련의들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 개원치과원장들은 제가 데리고(?) 있는 수련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월급 줄 걱정 안 해도 되지, 교수인 제가 시키는 일은 다할 것 같으니 몸 편하고, 논문 작성이 필요하면 주제만 주고 몇 번 확인(?)을 하면, 국제적 논문이 생산되는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을 상기하며, 매우 우수한 인재를 공짜로 데리고 있다고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쓴 웃음을 지은 바 있습니다.
저는 수련의 교육을 시키면서 수련의 덕분에 제가 편했다고 생각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인턴이라도 저희 과에 배치가 되면, 배치된 5~6주간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일반 수준의 치과의사로 만들기 위해 제 전공이 전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다가 야단이라도 치면 인턴과 같은 전공의에게는 ‘비인간적인 대우’ 내지는 ‘교수의 신경질’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에게 발생하면 조금 더 심각한 사태(수련 포기 등)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돼야 하므로, 때로는 웃는 얼굴로 다독거리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꾸짖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치협’과 정부가 마련해 준 예방치과 정원을 채워 수련의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수련병원 실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의 시각에서는 부드럽게 예방치과를 봐 주는 일은 없고, 당연한 일이지만 ‘꼼꼼이’ 우리의 규격을 검사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규격’에 맞추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후학’ 내지는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계속 마음속에서 솟아나니, 제 스스로가 저를 고생시키는 꼴입니다. 독자 분들 중에서는 왜 그리 ‘피곤하게’ 사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글을 쓰는 이 시기가 공교롭게 ‘리우 올림픽’ 기간이라 거실에서 환성과 탄식이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려 나가 중계를 보다 보면, 열심히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실력 차이가 드러나는 선수들을 ‘우승 후보’ 라든지 ‘금메달’ 후보라든지 하여 국민들 전체를 ‘희망 고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금메달’을 목에 건 선배들이 해설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축구 해설을 하는 ‘이 00’라는 선수 출신 해설자는 솔직하기로 유명합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지 못하느냐?’고 캐스터가 묻자, 그 대답은 명쾌했다고 합니다. “네,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배나 제자들을 ‘금메달’을 따오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본선 무대에서 창피하지 않은 실력은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수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일 ‘해설자’의 자리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나 교수는 자신의 후배나 제자가 ‘똑’ 소리를 낼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늦은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제 수련의에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전부 정해진 문이 있어서 그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고, 神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고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