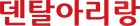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중고등학생 때 일렉 기타와 메탈, 락음악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 남고를 다니다 보니 비슷한 놈들이 여럿 있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아마추어 밴드를 하는 험상궂은 놈, 공부는 담쌓고 드럼 연습만 하며 사는 놈들과 누가 최고의 기타리스트인지, 특정 밴드의 어떤 앨범이 좋은지 이야기하곤 했다.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서로 영향을 준 나머지 이제 나름 전주만 들어도 밴드 이름을 맞추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줄줄 읊을 수준으로 가려던 즈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동아리 후배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바깥으로들리는 게 범상치 않았다. 이어폰의 울림판이 찢어지는 듯한 와장창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최소한 스래쉬 메탈이었다. 혹은 데스메탈. 호기심이 들었던 나는 후배에게 밴드 이름을 물어봤다. 질문을 받은 후배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말해드려도 모르실텐데요?”
그럴리가! 그 녀석이 나의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묘한 승부욕과 약간의 기분 상함을 감추고 표정을 관리하며 거듭 물어보자 그 녀석이 정말로 귀찮다는 듯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
“응? 뭐라고?”
“거봐요. 모른다니까요.”
“아니아니… 소리가 안들렸어.”
그 녀석은 더 귀찮아진 듯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웅얼거렸다.
“@#*&^@#$.”
“응??? 뭐라고???”
“아이참, 거봐요.”
그리고 그 녀석은 이어폰을 다시 꽂고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 나는 음운조차 못 알아들었다고. 밴드를 알고 모르고 이전의 문제라고. 아니 내 고막에 음운이 접수조차 안되었단 말이다. 그 때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패배감과 황당함은 이제 거의 사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밴드 이름은 대체 뭐였을까?
이태원에서 치과를 하면서 외국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비슷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싯적에 나름 토익, 텝스 900점이상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아무 소용없다. 그런 성적표 따위는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시도해봐도 좋다는 입장 티켓 수준의 의미밖에 없다. 영어의 발음과 억양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미국인 환자가 그나마 대화의 난이도가 제일 쉽다. 그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서 경험해온 듣기평가 성우의 표준 발음의 범주에 있다.
한편 동남아나 중동, 혹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의 영어는 대개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나 만약 그들이 자국식 영어를 고집한다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를테면 “닥터”를 “독토르”로 말하는 느낌이다. 이런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절반도 못 알아듣기는 일쑤고 어느새 나도 지지 않으려고 한국식 영어발음의 구수한 정도가 진해진다. 그래도 서로 사려깊은 이해심으로 발음의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서로 이해를 한 느낌, 정말 세계는 하나, 우리도 하나라는 느낌, 여기는 글로벌한 치과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실제 현실에서 제일 어려울 때는, 의사소통에 배려가 없는, 즉 나를 이해해 줄 의지가 없는 외국인을 만날 때다. 보통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치과가 무섭고 겁나고 여차하면 울어제낄 준비가 되어있는 미취학 아이들에게 내 혀 짧은 영어를 알아들어줄 배려심을 요구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무리다. 눈빛부터 반항기가 엿보이는 사춘기가 온 중2에게, 손짓발짓 다 해가며 설명하다가 무슨 원숭이라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심한 내상을 입어 한동안 이불킥했더랬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지간한 외국인 환자들은 서로를 위해 우리 병원에 계시는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원장님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데스크에서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뿔싸! 영어가 들려온다. 전화영어는 상대방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을 수 없어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데 아뿔싸! 들려오는 자기 소개를 들어보니 영국에서 전화를 했단다. 영국 영어! 대영제국의 그 역사와 오리지날리티가 넘치는 영국 영어는 한국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미국식 영어에 길들여진 나에게는 아예 영어가 아닌 것처럼 들린다.
여기가 한국의 치과인 걸 알고서 영국에서 전화했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지만, 그 쪽이 환자인건지 보험회사인건지 조차도 파악이 안된다. 뭔가 목소리는 열심히 들리는데 도무지 음운으로, 단어로 들리지를 않는 상황. 문득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며 기시감이 드는 시점이다. 전화기를 잡은 손을 떨며 파든? 파든? 두번 세번 물어보며 대화하다가 어느 시점에 아예 알아듣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응응 대답하며 얼버무렸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메일로 하자고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고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영국의 그 이는 누구였을까. 그 밴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